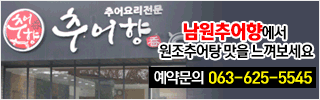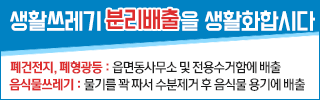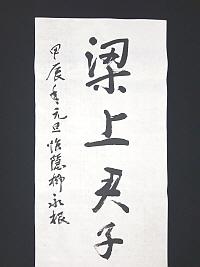- 2. 운명의 굴레를 벗기 위하여
“허허, 그놈 참. 용쏘의 구렁이한테 잡아먹힌 줄 알았더니, 살아 있었더냐?”
송림사 산문을 들어서자 법당에서 나오던 무형대사가 말했다.
“반야심경을 백번을 외워도 구렁이는 나오지 않고 먼 산부터 먼동이 트기에 대사님께 고하려고 갔더니, 코를 골고 계시기에 차마 잠을 깨우지 못하여 그냥 갔습니다.”
“허허, 넉살 한번 좋구나. 기왕에 왔으면 불목하니 노릇이나 착실히 하거라.”
“예, 대사님. 나무하고 불 때는 일에는 이골이 났습니다. 부처님 공양을 공짜로 축내지는 않겠습니다.”
자광은 그날부터 당장 송림사의 불목하니가 되었다.
나무를 가려고 지게를 챙기니, 지게가 너무 작았다. 끈을 길게 고쳐 매면 겨우 어깨에 걸칠 수는 있겠지만, 나무 몇 통가리만 얹어도 지게가지가 부러질 것 같았다. 누른대 집에서도 자광의 지게는 상머슴이라고 불리는 갑돌이 것 보다 두 배는 컸다.
큰 지게에 가리나무가 되었건 통나무가 되었건 양껏 얹어 지고 걸으면 웬만한 집채 덩이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
행자에게 도끼를 찾아 달라고 부탁한 자광이 우선 자기 몸에 맞는 지게부터 맞추었다. 목발과 가지가 다른 지게의 두 배는 될 만큼 컸다.
그 지게를 등에 지고 산으로 갔다. 아니, 산으로 갈 것 까지도 없었다. 산문을 나서면 모두가 나무였다.
그냥 아무데서나 갈퀴로 긁으면 가리나무였고, 톱으로 자르면 통나무가 되었다.
그러나 잠시 망설이던 자광이 지게를 진 채 뱀사골 계곡을 달려올라 갔다. 나무나 하자고 들어 온 송림사가 아니었다. 무형 스님의 말씀대로 불목하니나 되려고 입산한 것이 아니었다.
불목하니는 흉내였고, 나무하기는 공양값이었다.
한 식경 남짓 달려 올라가자 반야봉이 나왔다. 곳곳에 바람에 쓰러지고 폭설에 가지가 찢긴 나무들이 누워있었다. 적당한 자리에 지게를 받혀놓고 도끼질을 할 필요도 없이 손으로 뽑아 지게를 채웠다.
‘나무를 다 하였으니, 어떻게 한다?’
자광이 고개를 들고 산능선을 바라보았다.
‘저기 구름 너머가 천왕봉이렸다? 기왕 지리산에 들어 왔으니까 천왕봉에나 올라볼까?’
어제 밤 자정무렵에 누른대 집을 나오면서 지리산에 들어가면 가끔 천왕봉에나 올라가야겠구나, 생각은 했지만 오늘 당장 오를 생각은 아니었는데, 구름 속에 묻힌 찬왕봉을 꼭 만나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공양주 보살이 챙겨준 주먹밥을 단숨에 씹어 삼킨 자광이 천왕봉을 향해 달려 올라갔다.
지리산이 비록 높은 산이기는 해도 그렇다고 자광의 달리기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남원주변의 산이란 산은 자광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달리고 또 달리면서 자신 속의 화를 삭혔었다.
두어 식경을 달리자 하늘로 통한다는 통천문이 나왔고, 통천문에서 반식경 쯤을 달리자 천왕봉이 비로소 모습을 드러냈다.
천왕봉 봉우리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세상은 온통 구름바다였다. 하얀 솜을 깔아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 하얀 솜자락 위로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구름낀 천왕봉도 장관이구나. 가만, 지리산 천왕봉은 삼대가 공덕을 쌓아야 일출을 볼 수 있다고 했으렷다. 내 부친과 조부와 증조부께서 공덕을 쌓으셨는가, 안 쌓으셨는가는 몰라도 내 기어코 지리산 천왕봉의 일출을 보리라. 날마다 오르면 조상들의 공덕과는 상관없이 일출을 볼 수 있겠지.’
그런 작정을 하고 천왕봉을 내려와 반야봉에서 나무짐을 짊어졌다.
<다음호에 계속>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